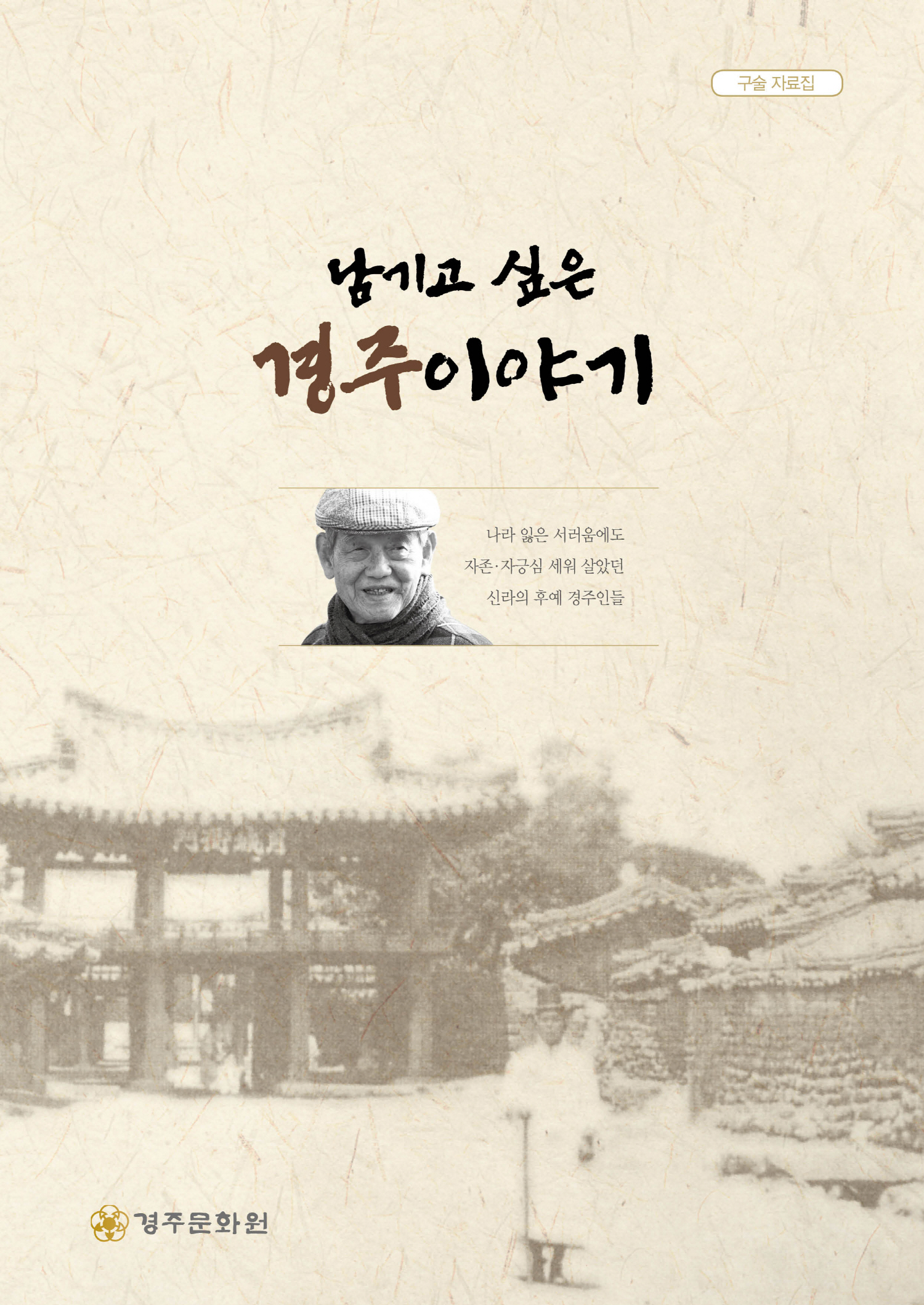
이 책은 ‘나라 잃은 서러움에도 자존·자긍심 세워 살았던 신라의 후예 경주인들’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일제강점기 혹독한 일제치하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사라져 간 경주의 풍광, 거리에 대한 증언집이다.
올해 89세인 김기조 전 경주문화원 원장의 구술을 촬영·채록해, 관련 사진들을 실은 500쪽에 가까운 ‘구술 자료집’이다.
“차라리 날 죽이고 동경관 뜯어가라”며 동경관의 붕괴를 막았던 사람들부터, ‘신라제’ 때 육촌장(六村長)을 내세워 일본 신사 앞에서 하려고 하자 신사의 축등을 불태웠던 기개 넘친 학생들, 발견된 금관을 지키기 위해 시민성금 모금을 주도해 금관고를 지었던 교리 최 부자댁 등 경주 유력자들의 활동, 창씨개명에 항거하다가 즉각 면장직에서 해임된 사람, 일제의 고문으로 시신이 되다시피 한 사람을 원장 댁 정지문을 떼서 옮겼던 숨겨진 일화, 전복 씨가 마를 정도로 감포 앞바다를 점령했든 일제에 맞서 항거했든 감포 해녀 이야기, 전통 유교 사회에서 여성도 배워야 한다면서 여학교 설립에 앞장섰던 사람 등, 경주사람들은 서러웠으나 자존·자긍심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았다.
또한, 현재의 경주 중심가 모습은 ‘읍성 붕괴’와 ‘경주역 이전’, ‘일제의 시가지 정비’에 따른 것이다. 현 서라벌문화회관에 첫 경주역이 들어섰다가 현 경주역 자리로 역이 이전되면서 유적지가 파괴되고, 도시변화의 단초가 됐다.
일제의 시가지 정비로 아문 주변의 시장과 상인들은 이리저리 내쫓겼다.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 시설이 서고, 관광객들이 경주로 몰려오는 등으로 근대기 경주는 변화도 많았고, 지금도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경주시 지원으로 발간된 이 사업은 2년 가까이 걸려 완성됐다. 경주의 역사 현장을 보고 듣고 자라 아흔에 가까워진 김기조 원장의 생생한 육성 자료집으로, 엮은이 최부식 이사(경주문화원)와 함께 경주 곳곳을 다니면서 옛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윤근 경주문화원장은 “지난 역사는 과거학이 아니고 미래학이다. 화랑로를 내면서 베어낸 등나무 휘감고 자란 천 년 노거수를 보존했더라면 얼마나 고도다웠을까?, 읍성을 복원하고 있는데, 그 중심의 동경관 객사를 교육청 지을 때 흘어 버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한 세기를 거슬러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난과 수탈을 당한 이야기가 있고, 여전히 경주 골목에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발간 여건상 흑백판에, 소량만 발간할 수밖에 없었는데, 향후 개정판을 기대한다”고 아쉬워했다.
최양식 경주 시장은 “단절돼 가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바람직한 경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바탕이 되는 데, ‘남기고 싶은 경주 이야기’가 큰 몫을 하리라 본다. 경주문화원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자료집 발간을 축하했다.
지금 경주시는 경주 읍성 복원에 매진하고 있다. 신라에 치중된 역사문화 사업에서 조선관부의 존재 사실을 일깨우고,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경주문화원은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으로 ‘경주의 조선 500년 역사를 찾다 - 경주읍성과 관부(官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발간된 ‘남기고 싶은 경주 이야기’와 함께, 세 가지 사업은 경주의 역사와 관광진흥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억은 물론 거리가 사라지고 사라져 간다. 잊혀지고 잊혀져가는 경주 근대기를 기록하는 일들이 더 늦기 전 확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