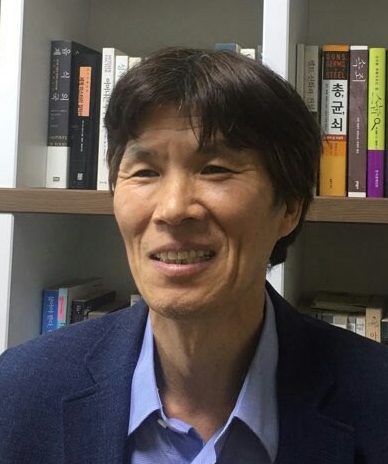
4·3 항쟁의 진실을 드러낸 작품이 ‘순이삼촌’이다. 작가 현기영은 작품을 통해 말한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다. (중략)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순이삼촌’이 나오지 않았다면 진실은 아주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을 것이다. 작가는 보안사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았다. 제주민중항쟁 1, 2, 3권을 쓴 김명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까지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한 대가는 혹독했다.
1947년 제주북공립국민학교에서 제28회 3·1절 기념대회가 열렸다. 모두 3만여 명이 참여했다. 당시 제주 인구가 27만여 명이었으니까 10분의 1일이 참여한 셈이다.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구호를 보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알 수 있다. 3·1정신으로 통일독립 쟁취하자, 친일파를 처단하자, 부패경찰 몰아내자 등이다. 미 군정 덕에 친일관료, 친일경찰, 친일군인이 다시 득세하는 시기에 열린 3·1절 기념행사였다. 독립 의식과 자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외칠 수밖에 없는 말이다.
제주도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주둔지이다. 6만여 명이 주둔했다. 군 비행장도 있었다. 일본군은 8·15광복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온갖 횡포를 저질렀다. 일본으로부터 귀환한 동포가 5-6만명에 이르렀다. 귀환 동포 가운데는 조국으로 돌아가 독립 국가를 튼튼히 세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자주 의식이 매우 강했다.
미 군정은 3·1절 기념대회 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행진을 금지시켜 군민을 자극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음에도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 발포까지 했다. 초등학생과 젖먹이를 안은 어머니를 포함하여 사람을 여섯 명이나 죽여 놓고도 사과는커녕 사람들 잡아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제주도민들은 3·10 총파업으로 맞대응했다. 발포자 처벌, 구속자 석방, 친일 경찰 축출을 요구했다. 제주도에 있는 거의 모든 계층이 함께하고 직장인의 95%가 참여했다. 미 군정은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켜 제주지역의 민족운동 세력을 뿌리 뽑으려 했다.
3·1절 집회 후 한 달 만에 500여 명을 체포했다. 사법처리한 사람만 328명이다. 이 시점부터 4·3이 발생하는 1년 동안 구금한 사람만 2500명에 이른다. 4·3 직전에는 고문치사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4·3 직후 군과 저항세력 사이에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깬 세력 또한 미 군정이다. 이때 화해로 마무리했으면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극단적인 국가폭력은 막을 수 있었다.
미 군정의 잘못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 군정은 남한에 대한 지배와 장악에 몰입한 나머지 또 다른 실책을 범했다. 이북에서 남하한 친일 세력이자 ‘반공, 반북 세력’인 서북청년회를 친일세력의 척결을 외치는 제주도에 투입했다. 이들이 포악한 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독일이나 일본에서처럼 전범을 제외한 모든 세력에게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치를 펴나갔다면 이승만 같은 극우 정권이 탄생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사냥하는 극우파시스트 세력은 발도 못 붙였을 것이다.
‘빨갱이’ 사냥에 혈안이 되어 온갖 행패와 살인행위, 테러를 일삼는 서북청년회를 제주에 투입하고 이들이 경찰과 군대 행세를 하도록 했고 이들이 살육을 해도 성폭행을 해도 묵인한 게 미군이다. 제주 지역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가운데 많은 부분은 서북청년회가 자행한 것이다.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서북청년회와 이승만 정권의 잔인성은 많이 드러났지만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묵인한 미국의 책임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 한국인이 잔인한 행위를 하는 건 묵인하고 부추기면서도 자신의 역할은 감추려고 무진 애를 썼다. 4·3 항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당시 미국이 자행한 반인권 범죄는 감추어져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