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검찰총장, 경북일보 일부 연재 새롭게 책으로 출간
126편의 한국·중국 시·문장에 지은이의 삶과 감상 등 녹여내

김 전 검찰총장은 글머리에서 "이 책은 원래 검찰을 떠나면서 짐을 챙기던 중 혹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하여 책상 위에서 나뒹굴던 시문을 한데 모아 퇴임식에 참석한 후배들에게 나눠 준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부득이 인쇄를 하게 됐다. 그 기회에 몇 사람을 추가하고 내용을 다듬었다. 이 책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그래서 온 누리에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김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직에서 퇴임했다. 법과 시 사이는 멀어 보인다. 그러나 법조인으로 자칫 메마르고 관성적으로 흐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그는 시로써 다스리고 사색의 깊이를 더했다. 저자는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뒤 가진 첫 간부회의에서 소동파의 시가 적힌 종이를 나눠주었는데,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건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가 빛나는 것'이라는 뜻을 시로 전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평생 법조인으로 한 길을 걸어온 그는 젊은 날 '한국의 유마'라고 불렸던 백봉 김기추 선생, 효당, 무천에게서 불교와 역을 배웠으며, 한문에도 능통하다. 한국, 중국의 한시와 문장, 불교 경전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음미하고 풀어낼 수 있는 내공이 여기에서 비롯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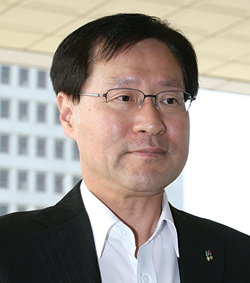
인물의 업적이나 과오를 따지기보다 당시 현실에 이입해 최대한 인간적으로 교감하고 이해하려 한 것이다. "어떤 존재라도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당시의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해하려 했다"고 저자는 밝혔다. 자연을 노래하고, 세상을 논하고, 사랑에 설레고 애달파 하고, 삶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선인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정회를 새삼 깨닫게 한다.
'흘반난'은 밥 먹기 어렵다는 뜻이다. '밥'은 생존과 직결된다. 인생은 알고 보면 밥 먹고 사는 여정에 다름 아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투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울고 웃는다. 법조인인 저자는 세상의 축소판인 법정에서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을 것.
이 책에 실린 시와 글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밥 먹는 것과 관련돼 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권력에 밀려나 유배를 떠나고, 아침엔 친구였던 이가 저녁에는 원수가 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 세상을 버리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 방랑하는, 인간사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읊은 시는 이들이 결코 암울함이나 슬픔 속에 계속 빠져 있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선인들이 글짓기를 통해 '밥 먹고 살기' 힘든 삶을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헤아렸다면, 시를 읽는 우리는 그 마음에 이입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 시 읽는 재미가 있다. 고려 때 선비 임춘은 가난과 실의 속에 시를 쓰며 위로받았는데, "나는 곤궁하면서도 시 또한 잘 짓지 못한다"며 애석해 하기도 했다.
저자 김 전 검찰총장은 "천 년 혹은 수백 년 전 선인들이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시 한 편, 글 한 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밥 먹기 힘든 세상 덜 외롭게, 좀 더 힘을 내서 헤쳐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