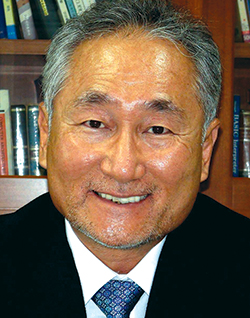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중략>
하버드대 신입생은 한 학기에 적어도 세 편 에세이를 써야 한다. 교수는 학생을 서른 명씩 맡아 일일이 글을 첨삭 지도한다. 하버드대가 사회에서 리더가 된 졸업생을 조사했더니 ‘성공 비결은 글쓰기’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인문학 공부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를 익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엔 ‘글쓰기는 학문이 아니라 언어 기술(技術)일 뿐’이라고 낮춰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글쓰기를 체계적, 실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드물다. 인문학 부활은 글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박해현, ‘만물상(萬物相)’, 조선일보, 2013. 6. 13’
위의 칼럼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①글쓰기를 언어 기술로 낮춰 봐선 안 된다. ②인문학 공부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를 익히는 과정이다.” 두 개의 발언입니다. 글쓰기를 단순한 기법의 문제로 간주해선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좋은 글쓰기의 출발점입니다. 글쓰기가 자신을 쇄신할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섰을 때 좋은 글이 나옵니다. 글쓰기야말로 인문학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주장도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 결국 우리는 자기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쓰기도 마찬가집니다. 자기소개서든, 칼럼이든, 시든, 소설이든, 우리가 무엇을 쓴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쓰는 일입니다. 간절함으로 자기에 몰두하면 쓸거리가 많아진다는 것, 마음을 비우고 다가오는 사건 사물을 공정히 대하면(확연이대공 물래이순응·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바른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자신만의 ‘비법’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졸저 ‘글쓰기 연금술’은 바로 그런 글쓰기 수련 과정을 안팎의 자료들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두 편씩 책 따라 써보면 절로 ‘글 잘 쓰는 비법’을 깨치게 될 거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모든 좋은 글쓰기는 반드시 ‘생리적 행복감’의 연원(淵源)이 됩니다. 글을 쓸 때 형언할 수 없는 자기 충족감이 찾아듭니다. 억지로 글을 쓰면서 좋은 글쓰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도 속이고 독자도 속이는 일입니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인문학 공부가 되는 글쓰기’가 아닙니다. 설혹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발견의 진실’을 담아내고 있는 글이라 하더라도 글 쓰는 이 스스로 그만큼의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글쓰기 상인(商人)이라고 해서 좋은 글을 못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글쓰기에 중독된 자들이 꿈꾸는 것은 언제나 ‘하나 살아남는 글쓰기’입니다. 그것이 10년 내든, 50년 내든, 500년 내든, 자기 하나 살아남아서 끝내 좌표가 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