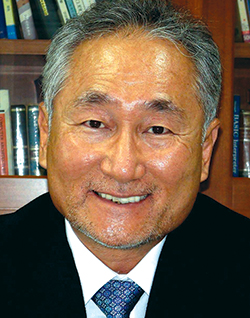
종교의 전제(前提)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명제(命題)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다”라는 말을 할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전제로 종교를 믿습니다. 당연히 구원(救援)이 없는 곳에는 종교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내세(來世)가 있는 것은 종교고 없는 것은 주술(呪術)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내세의 구원이 전제가 되면 종교이고 현세에서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면 주술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쉽게 구별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종교와 주술이 그렇게 쉽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구도(求道)의 길을 걷는 수행자를 제외하고는 현세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 종교를 통해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본인 사업 잘되고 자식 공부 잘하게 해 주는 것도 종교의 큰 임무이고요. 자기를 버리고 이타(利他)와 절제의 생활을 통해서 현세의 구속과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첩경이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도 종교의 주술성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룩하지만 신통력 하나 없는 종교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위안이 되는 값싼 점집을 찾고 싶은 것이 고해(苦海)를 떠도는 자들의 인지상정입니다. 평생 동안 종교와 친선을 유지해 온 입장이지만(두 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소감을 버릴 수 없습니다.
종교도 그렇지만, 사람도 대체로 구원에서 갈라집니다. 구원을 인간 조건의 하나로 인정(인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부분에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제가 얼마간 청강생으로 참여했던 한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엉거주춤, 마지못해 몇 년 따라다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정기적인 모임’에서 탈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나 성당에 나가거나, 부부 동행으로 주말 테니스 모임에 참여하거나, 월수금 저녁마다 동호인(검도, 배드민턴, 탁구 등) 모임에 나가거나 하다가 일시에 뚝 발걸음을 끊었을 때의 그 허전함이나 소외감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부 모임에서 빠져나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빠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모임에서 기독교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주로 동양 고전을 읽는 모임이었고 그 당시는 불교 유식론(唯識論) 공부를 하던 무렵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언가 동서의 균형감을 찾기 위해서였는지 잠시 짬을 내 그런 예외적인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이에게 그 모임에서의 독후(讀後) 소감을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백해무익한 책이다. 예수의 삶을 다룬 네 복음서 정도는 읽어줄 만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말씀’을 강조한 요한복음은 일말의 감동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전혀 의미 없는 ‘말들의 잔치’들이었다. 특히 구약은 악서(惡書)의 표본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말을 듣고 왜 내가 그 모임에서 빠져나왔는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애초부터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명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식이지만 종교의 힘은 ‘사랑’과 ‘구원’에서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삶의 목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시작했던 때부터 한 시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성인들의 말씀이 늘 그렇지만, 종교의 경전은 그 두 가지 삶의 목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서사체입니다. 이야기의 의도가 늘 그쪽을 지향합니다. 그런 서사체의 의도성을 무시하고 이야기의 겉 내용만 두고 선이니 악이니 신성이 있니 없니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부질없는 일일 뿐입니다. 사랑과 구원을 모르는 인생이 늘 그렇듯이 말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