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수필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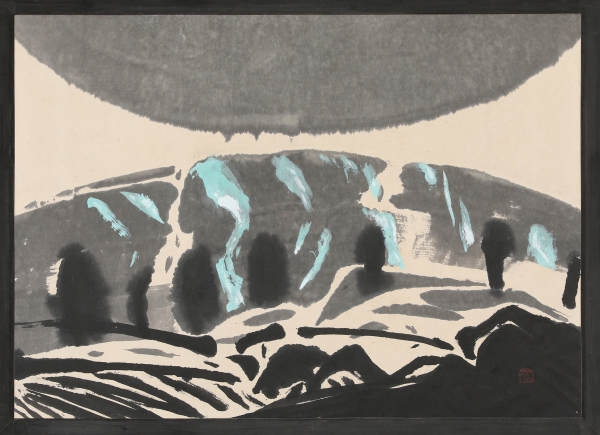
창밖이 뿌옇다. 무채색으로 천천히 변하는 광경은 하늘과 땅이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 같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 손을 휘젓는 사람처럼, 하늘에서는 땅 쪽으로 나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가 보다. 허공에 정지된 채 방향을 선뜻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망설이는 눈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민들레 꽃씨 같다. 혹은 밍밍하고 탄력없는 밥풀에 살짝 숨어있다 그윽하게 입안에 번지는 식혜의 맛처럼 달콤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랑처럼, 날리는 속도는 더디고 방향이 일정치 않다. 그래서 신비롭다. 소담스럽고 기운차게 펑펑 쏟아지다가 운명처럼 닿는 순간 더러 녹으면서도 순식간에 쌓이고 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에 발자국을 크게 내며 걷고 싶다. 결국 하늘과 땅 사이의 먼 간격을 무색하게 하며 기어이 만나버린 눈들의 조화에 대한 질투이다.
눈발이 가늘어진 걸까. 성질 급한 여인이 아파트 입구를 쓸고 있다. 조금씩 쌓여가던 팝콘같은 눈을 쓸어내리는 사각사각하는 싸리비 소리가, 눈을 먹던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그니에게 들킬까봐 커튼 뒤에 숨어서 내려다보았다. 두껍게 입은 옷과 털실로 짠 모자를 머리에 쓴 모습은 어느 한 시절의 어머니를 상기시킨다. 젊었을 적의 어머니와 얼마 전 이별하던 순간의 어머니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눈가가 뜨끈해지더니 순식간에 눈물이 후드득 떨어진다.
어린 시절, 눈이 내리면 동네 아이들이 모두 골목에 나와서 놀았다.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면서 눈 속에서 구르다시피 했다. 어둑해질 무렵이면 얼굴에서 올라오던 허연 김이랑 오슬오슬 떨게 하던 선뜻한 냉기가 생각난다. 서두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의 내가 보인다. 잃어버릴까봐 긴 끈을 연결해 목에 걸도록 털실로 짜 준 벙어리장갑과, 같은 색깔의 목도리는 얼어붙어 이미 기능을 잃었다. 운동화로 스민 눈이 발의 체온 때문에 녹으며 생긴 물기들 때문에 양말도 축축하곤 했다.
엄습하던 추위 때문인지 어두워진 시간 때문인지 마구 뛰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면,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던 난로 위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의 지청구는 그 소리에 파묻혀 버리고 얼었던 손과 발은 어느 새 그냥 스르르 녹아버린다. 밀려오는 허기와 함께였지만,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 마음이 푹 놓이던 훈훈한 기운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하다. 그래서 어릴 적 눈은 목화로 된 솜이불 감촉처럼 포근한 기억으로 남아있는가 보다.
고등학교 때 학년이 바뀌어 처음 친해졌던 아이와 첫눈이 오는 날 인근 성당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어떻게 그랬는지 저녁 자율학습시간을 빼먹으며 같은 학교의 같은 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길로 찾아가서 만났다. 소나무 빽빽한 정원 한가운데 밝혀진 여러 개의 촛불 때문에 더욱 경외롭던 성모상 앞에서 우린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생각해 낼수록 눈에 얽힌 추억들이 단단한 땅속에서 나오는 초여름의 포실한 감자처럼 줄지어 따라 올라온다. 어릴 적 눈은, 분석하거나 평가되지 않았으며 단지 반갑고 신기한 존재였다. 흰 눈을 꺼려하지 않고 눈에 대해서는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만지고 먹고 하는 것이 가능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눈은 사나이의 손때처럼 검을 수도 있다.’는 시구를 읽었을 때부터였을까. 눈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눈은 사람의 마음처럼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얗게 다 덮어버려 감춰주는 척하다가 태양이 뜨면 돌연 변심하여 모든 것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 보인다. 게다가 덮기 전보다 더 흉물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눈이란 변한 사랑의 마음처 럼 차갑고 냉정한 거라는 걸 이미 충분히 알기 시작한 즈음이었다.
눈은 빨래를 더디 마르게 했고, 얼어붙어 쌓여서는 거리를 빙판으로 만들기도 하였으며 녹은 다음에는 질척거려 내내 불쾌한 걸음걸이를 하게 했다. 눈을 맞으며 걸었던 자연스러운 낭만은 이미 과거의 먼 이야기가 되었다. 오염된 먼지와 함께 내린다는 사실 때문에 한층 더 무거워진 우산을 들어야 되었다.
이제는 눈이 와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집에서 창밖으로 바라만 본다. 멀리 바라보는 흰 눈이 쌓여지는 풍경은 여전히 근사하고 가슴을 설레게도 한다. 커다란 은빛 이불을 펼쳐 지상의 어떤 것이라도 가려주는 숭고한 역할을 해내겠다는 것 같아 내리는 이 순간만은 듬직하기까지 하다.
소르르 눈이 내리는구나. 아름답다, 라고 혼잣말을 해본다. 영화대사에서처럼 변하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시절에 따라, 내 가슴에 따라 희로애락은 늘 변한다. 무엇하나 내 것이 아닌 것은 없기에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야 한다.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이어주는 것, 결국 살아내는 일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의 연속이다.
낮이 물러가야 할 시간인데도 창밖이 조금 훤한 건 눈 때문이다. 어둠을 불러오는 주술사처럼 애절하게 부르는 Tombe La Neige 를 듣는다. 쉰 듯한 목소리 때문에 더욱 애절한 곡조사이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본다. 묻혀있던 오래된 기억들이 스멀거리며 고개를 내밀다가 황급히 눈과 섞인다. 연거푸 반복하여 노래를 듣는 동안 내려놓은 커피는 다 식어가고, 눈은 밤과 함께 느릿느릿 숨죽이며 세상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