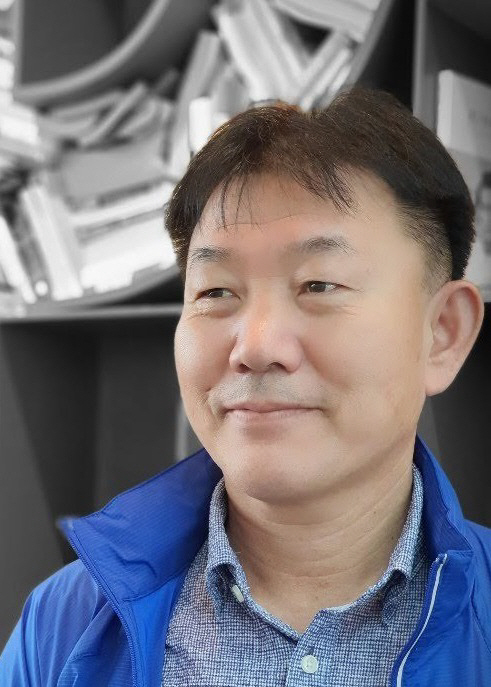
익숙한 공간과의 단절은 고통이다, 공간은 삶이다, 역사이기도 하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공간을 차단한다. 단절로 인한 상실의 시대다. 역병(疫病)이 삶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기피하게 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그렇게 ‘혼자’를 가두는 데 익숙해져 간다. 인간은 역병에 대응하기 위해 1인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역병의 집요함으로 철옹성을 쌓고 있다. 숙련은 습관이 되고 관습은 체질이 된다. 인간의 체취는 정겨운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됐다. 공동체와 미풍양속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673년 전인 1347년 10월 초, 흑해 카파항에서 출발한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 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거의 다 죽어 있었다. 항구의 부두노동자들은 전염병임을 직감하고 배를 먼바다로 내쫓는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역병은 이미 상륙해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것이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상선은 바다에서 40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입항을 할 수 있었다.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도 격리로 대처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병은 격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최첨단 과학시대를 사는 시대도 역병은 어쩌지 못하고 있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 격리의 미래는 사회의 해체다. 인간 ‘관계의 파괴’는 상실의 시대이다. 피터 드러커는 시간의 단절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간의 ‘단절의 시대’, 미풍양속 해체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말이 단절과 상실의 시대를 대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