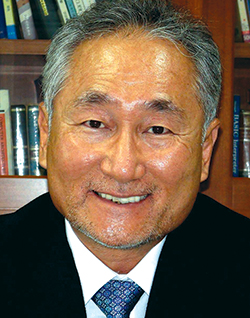
집이 시내에 있어 산책길에 도심(都心)을 거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 화교학교가 있는 중국인 거리를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꽤 되지만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곳이라 걷는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어제도 그 앞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길이 중국인 거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두어 군데 화상(華商)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보던 그 이국적인 복색들과 특유의 향내, 중국음식의 향신료 냄새를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치면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을 생각했습니다. 인천의 중국인 거리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격렬했던 전쟁의 상흔이 깊게 배어있는 곳입니다. 그곳 중국인 거리에서 6.25 직후의 밑바닥 인생을 체험하는 한 어린 소녀의 일상(지금의 관점에서는 반일상)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이사해서 온갖 끔찍한 것들을 목격한 소녀는 마지막을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비명과 언제부터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를 들으며 죽음과도 같은 낮잠에 빠져 들어갔다.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죄고 있을 후덥덥한 열기를….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그것은 바로 초조(初潮·첫월경)였다.”<오정희, 「중국인 거리」>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인천의 중국인 거리를 찾았습니다. 궁핍했던 소년기 때 어머니와 함께 이곳 외가 쪽 친지들을 방문한 지 50년 만의 일입니다. 유명하다는 월병도 사 먹고 공화춘의 짜장면 맛도 보았습니다. 아픈 역사는 말끔히 지워지고 따듯하고 밝은 햇살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중국인 거리」는 소설 「중국인 거리」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교사 친구가 제게 「중국인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에 불만이 컸습니다. “6.25 직후의 사회 현실을 알게 한다”라고 되어있다는 거였습니다. 내용 없는 지도 원칙이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발끈했습니다. “문학이 그런 것을 가르치라고 있는 거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문학? 문학이 가르칠 게 따로 있나?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다산성(多産性)과 오정희 소설의 그로테스크 미학’이나 ‘아버지의 부재(不在)와 오정희 소설의 모성성 과잉’이나 아니면 ‘여성의 성장에 있어서 초조(初潮)의 심리학적 의의’ 같은 걸 가르쳐야 문학인가?”라고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몰라도 ‘소년 주인공 소설이 지니는 이니시에이션(통과제의) 스토리로서의 작품성’이라든지, ‘소년기에 대면하는 악(惡)의 존재성과 작품 속의 엑조티시즘(이국취향)’ 같은 것들은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 다 가르치면 좋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것 아닐까? 왜 그런 끔직한 일들이 주인공 소녀에게 강요되었는가를 아는 게 우선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표현의 문제는 그 다음일 테니까. 시대적 배경이 명확한 소설일수록 더 그렇고. 또 ‘이니시에이션 스토리’가 남발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결국 소설은 누군가의 통과제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조자룡 헌 칼 쓰듯 쓰는 것도...”
이제 그 친구는 교직을 떠나 한가롭게 살고 있습니다. 「중국인 거리」도 이제 그에게는 한갓 옛날의 추억이겠습니다. 오늘도 그 언저리를 맴도는 저에게만 그 이방의 거리는 아직도 「중국인 거리」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