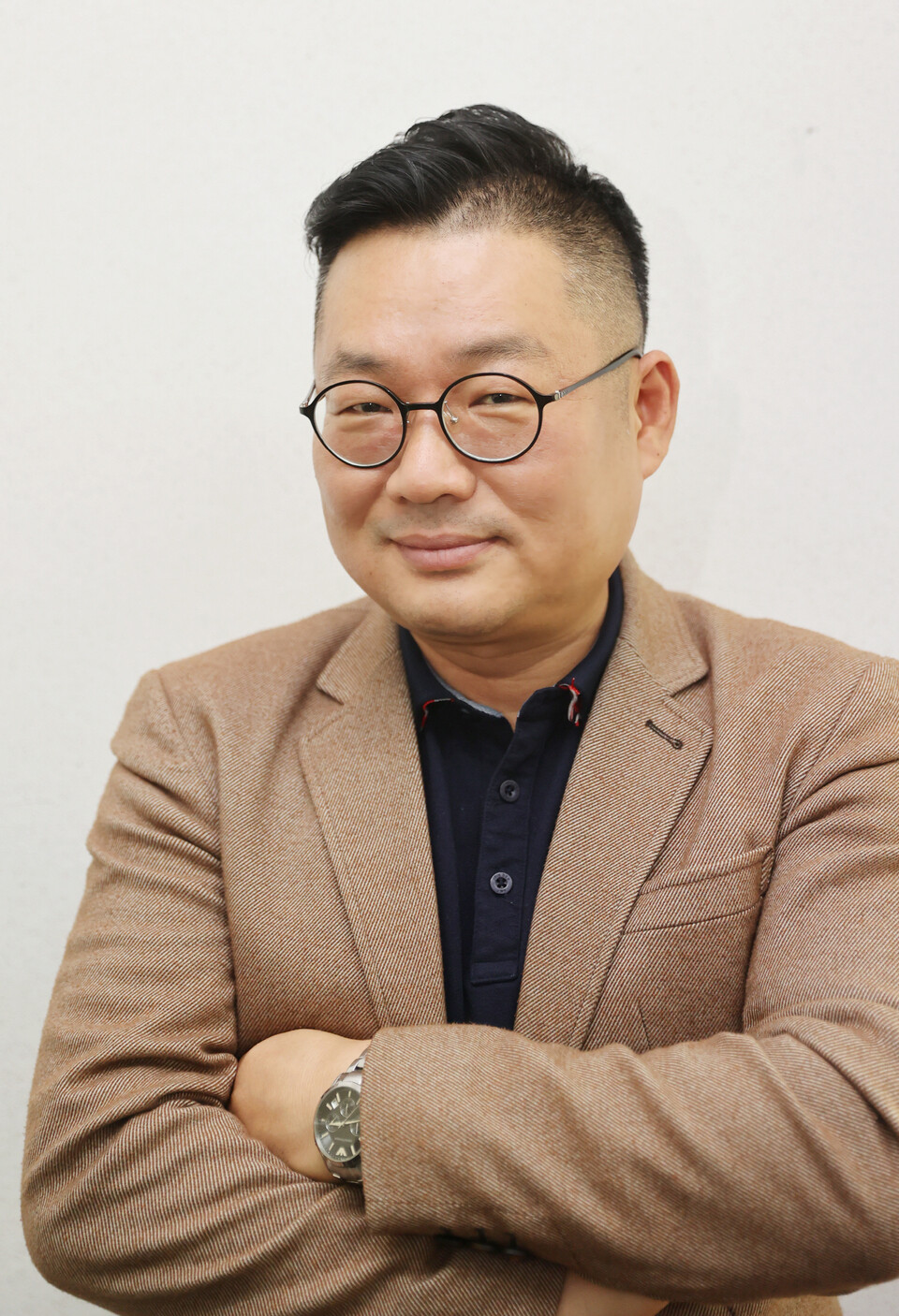
3월의 이야기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놨다.
대구의 한 사립고 신입생 아들이 대뜸 연봉이 얼마냐고 물었단다. 학교에서 나눠준 일종의 조사서류에 부모 직업을 적는 공간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은 아들에게 담임교사가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
정확한 아버지 회사 이름을 들은 담임교사는 그 회사를 잘 몰랐는지 아들에게 “아버지 연봉이 얼마나 되시노”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들이 아버지의 연봉을 물어본 이유다. 그 직원의 연봉은 1억 원에 가깝다.
직원은 “요즘 세상에 ‘아부지 뭐하시노’를 대놓고 묻는 자체가 놀라웠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 누구 아버지는 의사이고, 누구 아버지는 법조인인지 알고 있다고 아들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부모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 학교 자녀들은 우리 사회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를 원망할 것 같다”고 했다.
초등학교 시절 신학기 때마다 부모의 직업을 묻는 공간에 ‘회사원’, ‘상업’이라고 늘 적었다. ‘공무원’, ‘교사’라고 적을 수 있는 친구가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부모가 되고 보니 어린 마음이라고 하지만 친구 부모와 비교했던 게 죄스러울 뿐이다.
우리 딸도 고교 1학년이다. 지난 3월 학교에서는 집 주소, 부모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적도록 했던 기억이 난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과 같이 부모의 회사 이름과 연봉을 대놓고 물어보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여긴다.
“아부지 뭐하시노”는 20년 전 개봉한 영화 ‘친구’의 한 장면에만 머물길 기도한다. 대학 입시원서에서부터 취업원서까지 부모직업란이 모두 사라진 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