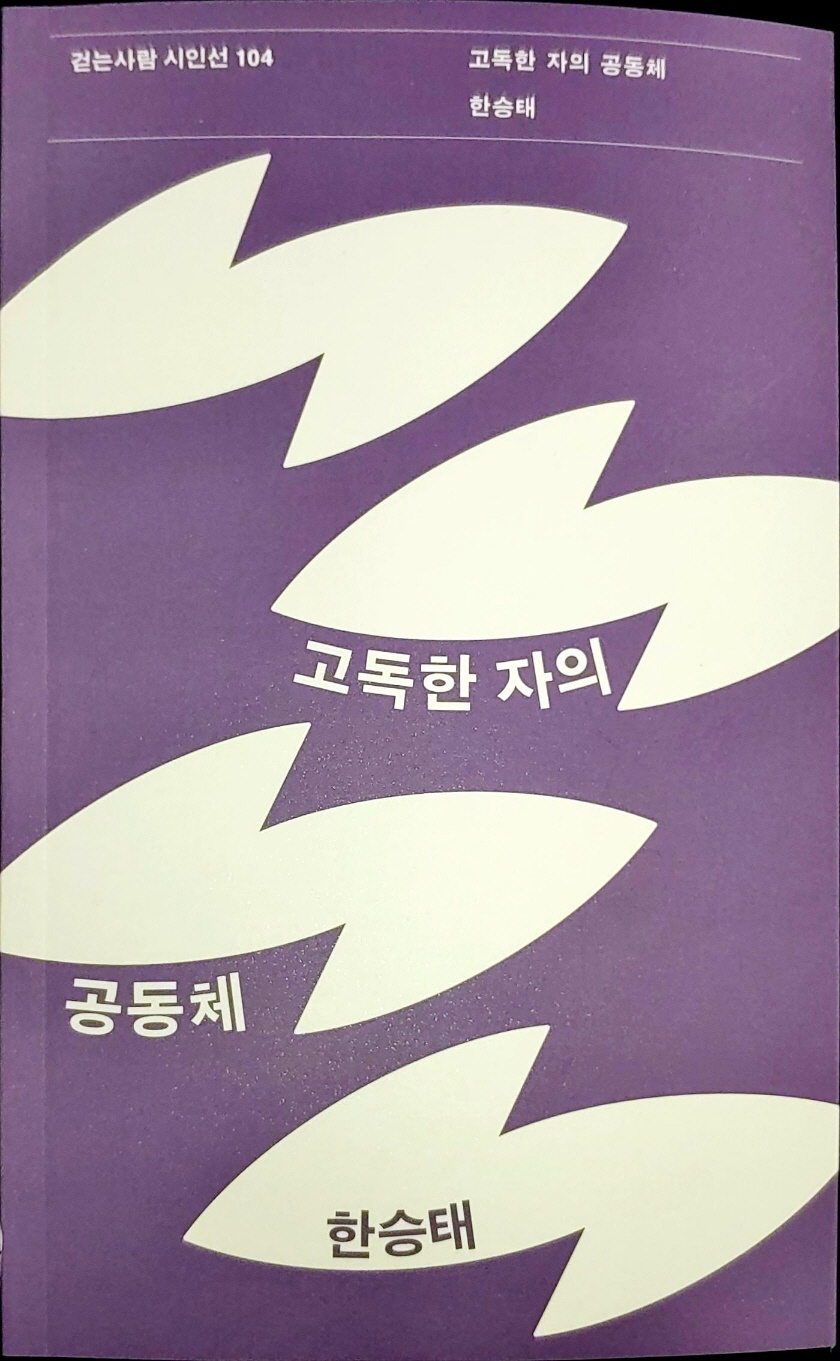
시집 ‘바람분교’, ‘사소한 구원’과 산문집 ‘#아니마-시와 애니메이션의 미메시스’를 집필하며 왕성한 활동을 선보여 온 시인 한승태의 새로운 행보다.
특히 이번 신간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위에서 시간과 삶의 퇴적이 오롯이 담긴 흔적을 정직하게 기록”(신철규 시인, 추천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리는 왜 고독할 수밖에 없는가.
시인은 이 질문에 골몰하며 가만히 걸음을 옮긴다. 진솔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하는 시인을 따라 발을 옮기다 보면, 과열된 공동체의 일부로 존재하는 화자들이 보인다. 이들은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 없는”(「출근길」) 세계에서 저마다의 자리를 책임감 있게 지켜내며 “연봉과 서열에 따라”(「다만 다리 밑을 흘러왔다」) 구분되는 삶을, “허기진 영혼마저”(「신석기 뒤뜰」) 빼앗기는 기분이 드는 현실을 묵묵히 감내한다. 오직 한 번의 쓰임을 위해 만들어진 “일회용 컵”에 적힌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당신이라는 안부」)라는 빤하고도 씁쓸한 안부와 “건너편 옥상에도 나와 같은 의자들”(「꿈틀거리는 어둠」)이 나란히 놓여 있는 쌉싸름한 장면이 거대하고도 일상적인 고독을 들춰내며 자본주의 사회의 면면을 투시한다.
시인의 통찰이 비단 거대한 공동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승태의 시 세계에선 모양도 크기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삶을 살피고 이해하기 위해 힘쓴다. “사는 소리”(「다행이다」)를 만들어내며 적막한 삶에 온기를 보태 주는 애틋한 이들, “모르는 이의 수고가 없다면 하루도 살기 힘든”(「전문가라는 직업」)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수고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니는 마음들까지도 섬세하게 보듬는 것이다. 그러니 삶을 공유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낡지 않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생이 꿈틀거리는 감각을 묘파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단독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위로 삼아 더 멀리 발을 떼어 보는 풍경은 눈부시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자연을 통해 지금 현실을 돌파하는 듯 보인다. “자연에 실수란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실수도 하는 거라”(「어른이라는 말」)는 위로나, “바다는 울기에 좋았다”(「~하고 울었다」)라는 고백처럼, 무릇 시란 우리가 가진 각자의 울음을 두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인지 모른다. 시인은 다만 “겨울은 간다 가고야 만다”(「차례」)라는 진실을 안다. 그러니 “그저 품어 줄 친구가 되려니 하고”(「소래포구에서」)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켜 주는 것이 고독으로 가득한 생을 대하는 우리의 소임이라고, 시인은 말하는 듯하다. “작은 울음은 울음끼리 뭉쳐 밤하늘에 둥그러지”(「울음 한 그릇」)듯이, “먼 데를 떠돌던”(「울음이 찾아왔다」) 조그마한 개인인 우리가 모여 또 하나의 공동체로 완성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희망적이다. “마음은 어디부터 시작할까 몸은 어디부터 내 몸이고 너에게 어떻게 건너갈까”(「나뭇잎은 벨라차오 벨라차오」)라는 속삭임이 유효한 것은 그 때문이리라.
해설을 쓴 박다솜 문학평론가는 이 시집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인간을 자연과 멀어지게 만든 산업화를 비판”하는 지점에 주목하며 “한승태의 시적 화자는 속절없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상실된 것들을 애도하는 한편,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일의 어려움을 노래”하고 있다고 밝힌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은 결국 실패란 것을, 따라서 나 역시 실패할 것을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한승태의 시에서 짚어낸다. “그늘까지 녹으려면 꽤 지나야겠지만 오는 봄을 막지 못하듯”(「차례」), 이 책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해 드는 방향으로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