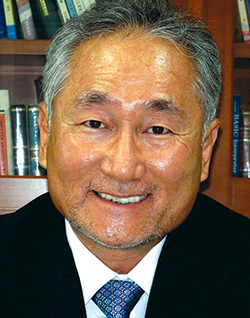
넷플릭스에서 <낙원의 밤>(박훈정, 2021)을 또 봤다. 이번에는 태구(엄태구)가 죽고 재연(전여빈)이 복수하는 장면만 봤다. 몇 번을 봐도 암흑가의 실력자 마(馬)이사(차승원)는 여전히 ‘낭만적 허위’이고 양아치 건달 양사장(박호산)은 여전히 ‘소설적 진실’이다. 이 영화의 재미는 마이사의 허풍이 책임지고 이 영화의 교훈은 양사장의 비굴이 떠맡는다. 마이사는 전편을 통해 능력 있고 잔인하지만 분별 있고 의리 있는 ‘형님’으로 나오지만 현실의 인물이 아니다. 그는 ‘이야기 전통’ 안에서만 살아있는 인물이다. 그와 반대로 양사장은 끔찍한 시정잡배 빌런(악당 중의 악당)이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인물이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사장처럼 살아간다. 가장 약한 자였던 재연(그녀는 병들어 죽을 운명이다)이 권총 한 자루로 순간 모든 악당들을 약한 자로 만드는 반전이 통쾌해서 이 부분을 자주 돌려 본다. 억울하게 죽는 엄태구의 비극이나 구역질 나는 양사장의 파렴치는, 뒤집어 보면, 모두 그들이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낙원의 밤>의 소설적 주제는 ‘약한 자의 슬픔’이다.
<낙원의 밤>에서 가장 약한 자는 누구일까? 현실(의 영화)에서는 태구가 죽는 순간 이야기가 끝난다고 보면 당연히 태구다. 그는 희생양이다. 그러나 영화(의 현실)에서는 양사장이다. 온갖 파렴치한 행동은 혼자서 다 저질러 놓고 관객들에게 일말의 동정도 사지 못한 채, 그 질긴 목숨 하나도(아마 총알 열 발은 넘게 맞고 죽는 것 같다)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양사장이야말로 가장 약한 자다. 그가 온갖 협잡과 배신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도 결국 그의 약한 자 신세가 강요한 일이다.
젊어서 양사장 같은 자의 수하로 들어가 영락없는 태구 신세가 될 뻔한 적이 있었다. 사는 게 온통 <낙원의 밤>이었다. 마이사와 그의 부하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다. 일생에서 가장 약한 자로 살던 때였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곪아 터져서 글 한 줄 쓰지 못할 때였다. 여러 군데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가까이 지내던 한 글쓰는 후배가 “소설이나 쓰면서 고고하게 살 분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라고 위로 반 꾸지람 반의 말을 전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모두 내가 약한 자여서 빚어진 일이었다. 제대로 인간답게 살려면 그 약한 자 신세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 즉시 <낙원>을 떠났다.
내가 떠난, 내 <낙원>의 마이사와 양사장은 결국 재연의 총탄에 피투성이가 되어 영화 밖으로 실려 나갔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시와 냉대와 자괴감과 쇠한 육체뿐이었다. 모두 나가야 할 때 선뜻 나가지 못하고 영화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문 업보였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한갓 새벽 잠결에 스치고 지나가는 개꿈과 같은 것이다. 그걸 알고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면 살고 끝까지 뭉개고 앉았으면 죽는다.
아주 옛날, 초등학교 다니던 집 아이가 애니메이션 영화 <드래곤 볼>을 보고 또 보던 일이 생각난다. 아이는 내가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비디오 가게에 가서 <천장지구>나 <영웅본색> 같은 홍콩 느와르영화를 빌려올 때면 꼭 따라나서서 그 위에 <드래곤 볼>을 얹곤 했다. 본 걸 또 빌리는 거였다. 매번 같은 일을 당하면서 “왜 같은 걸 또 보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새 걸 골라보라고 권해도 아이는 늘 그것만 고집했다. “왜 본 걸 또 볼까?”, 그때는 그게 의문이었다. 요즘은 손자가 내 책상의 보조 노트북을 차지하고, 내 옆에 딱 앉아서, 키즈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한다. 본 걸 보고 또 본다. 타요 버스도 보고 유라 언니도 보고 예준이의 장난감 놀이도 보고 뽀로로의 여러 가지 교우생활도 본다. 아직 마우스를 만지지 못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손으로 화면을 찍으며 나를 조른다. 그 옆에서 나는 <낙원의 밤>을 또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