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방향 따라 거침없는 탐색과정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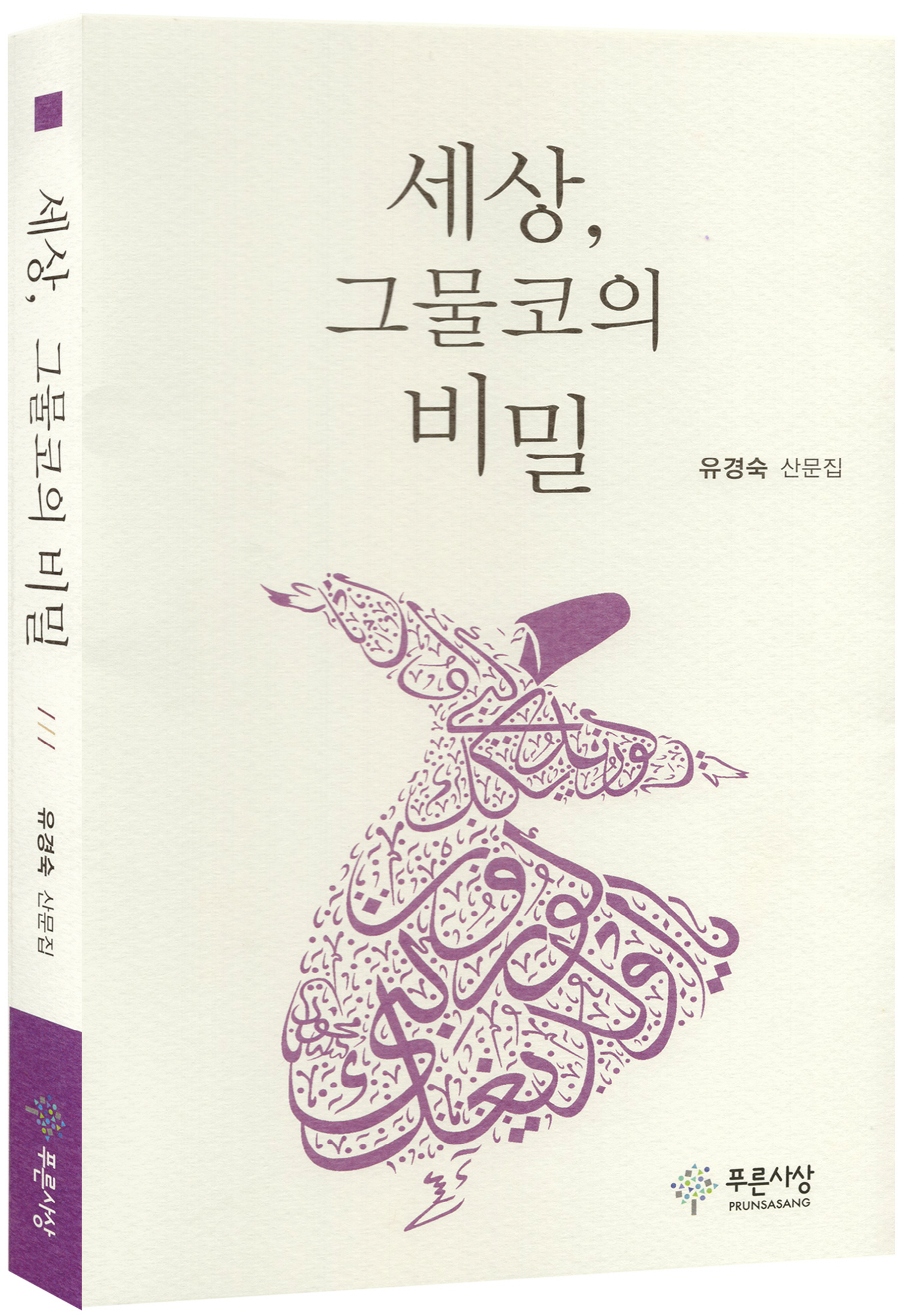
유경숙의 산문을 모은 ‘세상, 그물코의 비밀’이 푸른사상사에서 출간됐다.
작가는 대뜸 “세상사, 창랑의 물이 맑은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사물과 생물에는 그것만이 지닌 세밀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작가만이 포착했을 세밀화의 진경이 궁금하다.
작가는 책머리에서 얘기한다.
“세상사, 창랑의 물이 맑은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창랑의 물이 맑으면/갓끈을 씻고/창랑의 물이 흐리면/내 발을 씻으리.’
‘초사(楚辭)’굴원 편에 나오는 ‘어부사’의 노랫말이다.
나는 여기서 굴원의 청렴보다 어부의 노랫말에 방점을 찍어야 옳다고 믿는 사람이다. 한때, 고전은 나의 정신적 밥이었지만, 일찍이 곁길로 빠져, 상앗대로 장단을 치며 떠난 어부처럼 실용을 찾아 세상을 떠돌았는지도 모르겠다. 이즈음은 강물이 맑고 탁한 것을 따지기보다 그 물에 발을 씻고 어딘가 다른 여정으로 건너갈 것을 꿈꾼다. 내 더러운 발을 씻기에 탁한 물마저 고마울 뿐이다. 애초부터 내게는 추상(推尙)할 갓끈도 없었을뿐더러 따를 학파나 고귀한 이념도 없었다. 그런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고 글을 쓰려 노력했다. 그러기에 여기 실린 짤막한 산문들도 주류 문학이나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강가의 늪이나 못가에서 어슬렁거리다 한 토막씩 건져 올린 잡스러운 것들이다.
세상의 사물과 생물에는 그것만이 지닌 세밀화가 숨겨져 있다. 제 살 궁리로 골몰하는 치열함, 그것이 어떤 그물코를 만들고 세상과 소통을 시도하고 연결되어 하나의 종(種)을 유지하며 살아내는 것, 커다란 수레바퀴 같은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지? 내가 세상을 걸으며 만났던 모든 낱생명의 식물과 동물 그리고 무생물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자연현상과 세상과의 관계, 저들의 세밀화 속에 숨겨진 지문을 찾고, 생명의 들숨과 날숨소리를 듣고 또 미세한 떨림을 관찰하여 인간의 언어로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글쓰기 작업이다. 옛사람들은 사물 속의 정밀을 어떻게 관찰했으며 교감의 신호를 읽어냈고 메커니즘을 꿰뚫었을까. 책에서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의 의문이, 이국의 낯선 땅을 걷다가 번쩍하고 뒤통수를 칠 때가 있었다.
내 삶의 절반의 안내자는 여행이었고 책이었다. 여기서 얻은 소재나 경험이 글의 동력이었고 살게 하는 힘이었다. 이제 창랑을 건너왔고 맑고 흐렸던 때를 수없이 지나 강을 거슬러 고요한 골짜기에 다다랐다. 생(生)의 저물녘에 행운이 따른다면, 나의 민낯과 내면의 깊이까지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처럼 맑은 옹달샘 하나 만나서 깨끗하게 세수할 수 있었으면.
젊은 날, 내 꼴은 코나투스(conatus)와 이성 간에 고삐 채기 투쟁으로 여기저기 뿔이 솟아, 꼴불견이었을 것이다. 스스로 낸 상처 안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젊음은 쏜살같이 내빼버렸다. 이제야 내면의 힘이었던 코나투스가 보이고 그 뿔을 죄고 다스릴 감이 잡히는 중인데…….
‘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나만 홀로 맑고, 모든 사람이 다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다’라는 생각은 동종 생물에 대한 반칙이지 않은가. 그때, 상강(湘江)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늙은이로 강가에 쭈그려 앉아 세상 탓만 하고 있을까? 아찔하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경숙 작가는 2001년 ‘농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첫 창작집 ‘청어남자’(2011)와 e북 중편집 ‘백수광부의 침묵’(2016) 그리고 ‘베를린 지하철역의 백수광부’(2017) 엽편소설집을 출간했다. 국제문학단체 ‘한국 카잔자키스의 친구들’ 회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