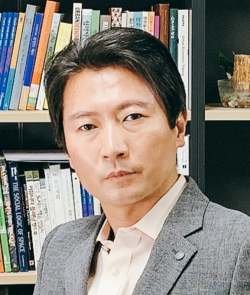
‘병원’이 새해 초반 모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포문을 열었다.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 공약 때문이다. 이슈는 다시 지역 간 의과대학 유치 전쟁으로 이어졌다. 내가 사는 포항만 해도 ‘연구중심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비장한 플랙카드가 곳곳에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야당 대표의 지방병원 기피 논란이 정점을 찍고 있다. 부산 방문 중 피습된 야당대표가 지역의 외상센터를 마다하고 굳이 헬기로 서울대 병원까지 옮겨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이 사태들의 진짜 키워드는 ‘병원’이 아니라 ‘지방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여건 불균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인지에 대한 맥 빠진(?)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50명 중에서 서울이 아닌 곳을 선택한 경우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예상과는 좀 달랐다. 학생들은 좋은 직장보다도 ‘좋은 기반시설 여건’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업시설이나 학교, 병원 같은 민간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 삶의 조건이 다 기반시설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지역 기반시설 네트워크에 나 자신을 로그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방 의료시설 낙후의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좋은 여건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 모든 기반시설에는 위계가 있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규모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백화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최소 50만의 인구규모가 필요하다. 포항시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비로소 백화점 한 개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형마트 하나만 해도 만만치 않다. 최소 10만 이상의 대상 인구가 있어야만 마트 하나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기반시설에는 그 위계에 맞는 입지가 있다. 그리고 고급한 재화나 서비스를 다루는 기반시설일수록 그에 필요한 인구규모도 커지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에서 의료 불균형의 문제가 시작된다. 3차병원으로 불리는 대규모 종합병원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제일 위계가 높은 시설로 알려져 있다. 500개가 넘는 병상과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유지하려면 자체 의과대학이나 대기업의 후견 정도는 필수이다. 인구가 부족한 지방 여건으로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보니, 환자들은 경부선을 타고라도 무조건 상급병원으로 가고 싶어 한다. 결국, 수도권의 알만한 큰 병원에는 그 규모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환자가 몰리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그럴듯한 병원을 세워 놓아도 운영난에 시달리곤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최종적인 관심사로 가보자.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정책들은 과연 의료 불균형의 이런 흐름을 돌파해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식견 있는 의사 분의 솔직담백한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지방의대 설립 등, 일단 찬성은 하지만, 그럼에도 그 궁극적인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좋은 지역 병원을 만든다 한들, 전국구급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기는 쉽지 않고, 또 배출된 의사들이 취지대로 지역 의료에 전념해줄 것인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하기야, 시설이야 정책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지만, 사람들의 선택까지도 제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의료균형 정책에 앞장선 사람들조차 지방보다 중앙 의료시설을 선호한다는 의혹이 나타난 지금, 그 정책들의 효과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