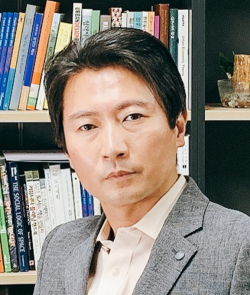
등산로 입구를 지나다 보면 크고 작은 돌들을 탑처럼 쌓아놓은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산의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한 일종의 샤머니즘 관습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참 묘하게 만든다. 그냥 가자니, 남들이 다 비는 복을 나만 지나치는 것 같아 아쉽다. 그렇다고 돌을 올리기엔 위험부담이 크다. 수많은 돌이 쌓여 있다 보니, 맨 위에는 아주 작은 돌이 간신히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면 기분 좋은 등산이 되겠지만, 잘못해서 탑을 자극해 와르르 무너뜨리기라도 하면 낭패다. 행운은커녕 불운을 가져오나 싶어 기분이 찜찜해진다. ‘돌탑 쌓기의 딜레마’라고나 할까. 나중에 올리는 사람이 그동안 쌓인 부담을 모두 져야 하는 소위 ‘독박’의 게임인 것이다. 뜬금없지만, 우리나라의 재건축이 이렇게 돌탑 쌓기 같지 않은가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을 완화하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지은 아파트단지가 서울·경기에 빼곡하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를 생각하면, 정치권 입장에서는 수도권 표밭을 공략하는 데 이만한 수단도 없다. 타협 없는 여야지만, 재건축 완화에서만큼은 서로 앞장서겠다고 난리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건축 완화책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이다. 우선은 안전진단의 생략이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이제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작년이 이미 나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완화책들이 재건축을 돌탑 쌓기처럼 만들어간다는 데 있다. 잠깐의 호흡기를 달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재건축의 돌탑은 더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워진다. 주택가격도 한없이 올라갈 리 없고, 용적률도 오를 만큼 오른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이 오히려 돈을 벌어주는 장치가 된 것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이한 역사와 관련이 깊다. 초기 아파트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대규모 단지형이 주종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용적률이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여의도 건설된 아파트 단지 중에는 용적률이 80%에도 못 미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치솟았고, 용적률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올라가 지금은 300퍼센트에 이르렀다. 5층, 10층 정도가 고작이던 아파트가 이제는 수십 층 규모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다 보니, 헐고 새로 지을수록 오히려 이익이 되는, 행복(?)한 재건축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이한 행복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다. 우선 아파트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 지방에서는 이미 미분양이 판을 치는 지경이다. 용적률도 한계에 달했다. 대부분 아파트가 용적률을 소수점까지 알뜰하게 채우고 있다. 이제 재건축을 한다 해도 더 올릴 가격도, 층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결국 재건축 비용을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 시기를 미뤄보려는 임시방편에 다름 아니다.
물론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처지도, 그들의 민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상황도 당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담의 시기를 자꾸 미루기만 한다고 될 일일까. 당장 한 번 더 재건축을 가능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럴수록 돌탑은 점점 위태로워져 갈 뿐이다. 결국에 누군가는 고스란히 쌓인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예고된 인구감소와 공동화의 시기에 재건축의 폭탄까지 떨어진다니, 상상하기조차 싫다.
재건축도 세대 간의 문제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재건축의 돌탑에 마지막 돌을 올려야 하는 후세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제 건설주택 정책에 ‘세대 균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균형은 지역 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세대 간에도 분명 필요한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