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가 결의로, 말이 윤리로 길 위에서 만난 공의의 정신

어디로 향하든 여행길에 오르는 순간 마음은 늘 설렘으로 출렁인다. 그러나 고향을 향한 여정만큼은 조금 다르다. 발걸음을 내딛는 그 찰나부터 이미 마음은 동네 어귀에 닿아 있는 듯, 기억 속 풍경들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피어오른다. 바람결마저 따스하게 감도는, 깃털 같은 여행의 시작이다.
가을이 깊어진 지난 10월 25일 아침, 서울을 떠난 버스가 예천 들녘에 닿을 무렵 덕봉산 능선 위로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재경대창중고총동문회·수주회·경언포럼 회원 25명이 함께한 ‘아주 사(史)적인 문화답사-오늘의 시선으로 과거를 새롭게 읽는다’는 이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예천의 역사 속에 숨어 있던 성소와 공의, 그리고 연대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기억의 윤리’를 되짚는 인문 탐방이었다.

△하늘과 백성이 함께 기도하던 성소 -장군바위.
덕봉산 중턱에 자리한 장군바위는 예천의 진산(鎭山)이라 불린다. 이곳은 가뭄이 들면 관민이 함께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제를 올리던 예천의 수호 바위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의 ‘집강소일기’에는 장군암 제의와 전투 기록이 나란히 실려 있다. 제사가 곧 결의였고, 기도가 곧 행동이던 시대였다.
바위 북쪽에 남은 성혈(性穴)은 선사시대 제천의 흔적을 품은 채, 인간과 신이 교감하던 신성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예천이 ‘성소(聖所)’라 불렸던 이유는 바로 이 바위에서 비롯됐다.

△공동체가 세운 ‘공공선의 기념비’ -개심사지 오층석탑.
길은 이어져 예천읍 남본리 개심 사지로 닿는다. 들판 한가운데 우뚝 선 오층석탑은 천 년 세월을 견뎌온 ‘공동체의 기념비’다.
현종 2년(1011)에 완공된 이 탑의 기단에는 팔부중과 십이지신상이 새겨지고, ‘광군 46대, 소 천두, 인원 일만인’이라 새긴 탑기가 당시의 시대정신을 증언한다.
거란의 침입으로 세상이 불안하던 시절, 향리와 백성, 장인과 승려가 힘을 모아 세운 탑은 두려움을 넘어선 연대의 상징이자 공공선(公共善)의 기록이었다.
하늘에 기도하던 바위와 땅 위에 세워진 탑, 두 유적은 시대를 넘어 서로를 비춘다. 기도가 결의로, 결의가 공동체로 이어지던 땅. 예천의 정신이 그 안에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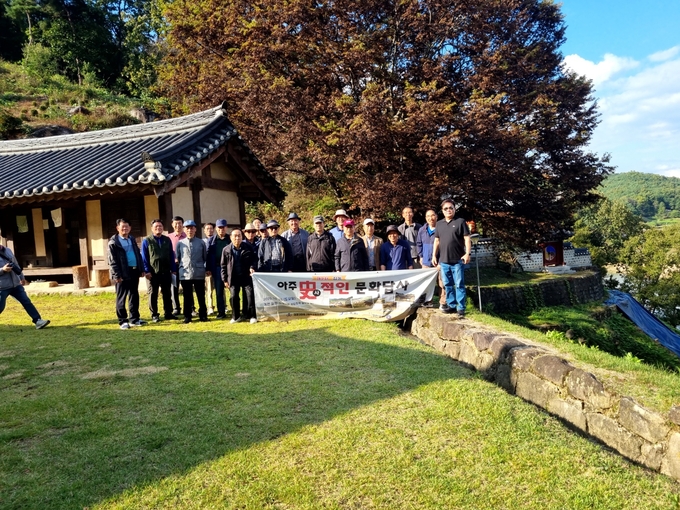
△공의와 직언의 정신을 품다 -도정서원과 읍호정.
내성천의 물결이 느릿하게 흐르는 언덕 위, 도정서원은 흰 담장 너머로 고요를 품고 서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생명을 구한 약포 정탁(鄭琢)과 그의 아들 청풍자 정윤목(鄭允穆)을 함께 모신 사당이다. “적이 두려워하는 장수를 어찌 죽이겠는가.” 약포의 한 문장은 공의(公義)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전한다.
서원 정자 안에는 퇴계 이황, 윤두수, 정온 등 조선 지성들의 시문이 걸려 있다. 그들의 글씨는 오늘날에도 ‘공적 언어’의 무게를 상기시킨다.

△나쁜 말을 묻은 ‘말의 무덤’ - 대죽리 언총.
서원을 뒤로하고 지보면 대죽리 언덕을 오르면 ‘언총(言塚)’이라 불리는 작은 봉분이 있다. 갈등이 잦던 마을 사람들이 험담과 거짓말을 종이에 적어 묻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말’을 묻어 ‘평화’를 얻은 마을, 그 지혜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SNS의 독설과 허위가 난무하는 시대에, 언총은 말의 윤리를 일깨우는 경계비다.
공의의 서원과 침묵의 언총,하나는 올곧은 언어의 힘을, 다른 하나는 침묵의 미덕을 말한다. 그 사이에 예천 사람들의 품격이 있다.

△공적 윤리의 기념비 - 유일한 박사 생가터.
언 총에서 멀지 않은 예천의 골짜기, 조용한 들녘에 유일한(1895~1971) 박사의 생가터가 있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던 그의 신념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남았다. 친인척을 배제한 경영, 전 재산의 사회 환원, 그리고 교육과 복지로 이어진 유언. 그의 삶은 예천이 길러낸 가장 빛나는 ‘공적 윤리의 한국적 모델’이었다.
△600년 회화나무 그늘 아래 - 우망리 삼수정.
길은 다시 풍양면 우망리로 이어진다. 세 그루의 회화나무 아래 자리한 삼수정(三樹亭). 1425년 입향한 동래정씨 정귀령의 호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삼’은 천·지·인을, ‘수’는 자손의 번영을 뜻한다.
지난 9월, 입향 600주년을 맞아 500여 종친이 모여 뿌리를 기념했다. 삼수정의 회화나무는 600년 세월을 거슬러 땅과 하늘을 잇는 생명의 상징으로 서 있다.
유일한 박사의 생가와 삼수정의 회화나무, 둘 다 ‘뿌리의 윤리’를 말한다. 한쪽은 기업가의 신념으로, 다른 한쪽은 가문의 정신으로. 예천의 시간은 그렇게 사람과 나무, 신념과 혈맥으로 이어져 있다.

△신뢰의 나루 - 삼강주막.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 세 강이 만나는 지점, 삼강나루에 닿으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주막 하나가 서 있다.
‘글 모르는 주모’가 부호로 외상장부를 적었다는 전설의 그곳, 삼강주막이다.
돈보다 믿음이 앞섰고, 거래보다 신뢰가 먼저였던 시절. 주막의 벽에는 ‘신용의 역사’가 묻어 있었다.
낙동강 물길을 따라 쌍절암 생태숲길과 대동정이 이어진다. 바람은 여전히 강을 타고 흐르고, 길은 사람을 따라 이어진다. 삼강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길과 사람과 물길이 교차하며 ‘연대의 정신’을 새긴 땅이다.
하루의 여정을 마치며 답사단은 조용히 묻는다.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연대를 세우며, 어떤 길을 다음 세대에게 내어줄 것인가.”
장군바위의 기도, 석탑의 연대, 서원의 직언, 언총의 침묵, 기업가의 윤리, 집성촌의 뿌리, 주막의 신뢰.
예천의 풍경은 달라도, 그 속에는 하나의 정신이 흐른다.
수주회가 제안한 ‘약포로(藥圃路)’ - 예천에서 서울, 통영으로 이어지는 기억의 길. 길이 곧 약이 되고, 약이 곧 희망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선다.
글·사진=황우섭 재경대창중고총동문회·수주회·경언포럼 회장(전 KBS 이사)/정리=이상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