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허 위를 걷는 다섯 청년의 여정과 우정·연대의 회복 담아
멸종 생명들의 기척까지 품어낸 생존주의 시대의 새로운 문학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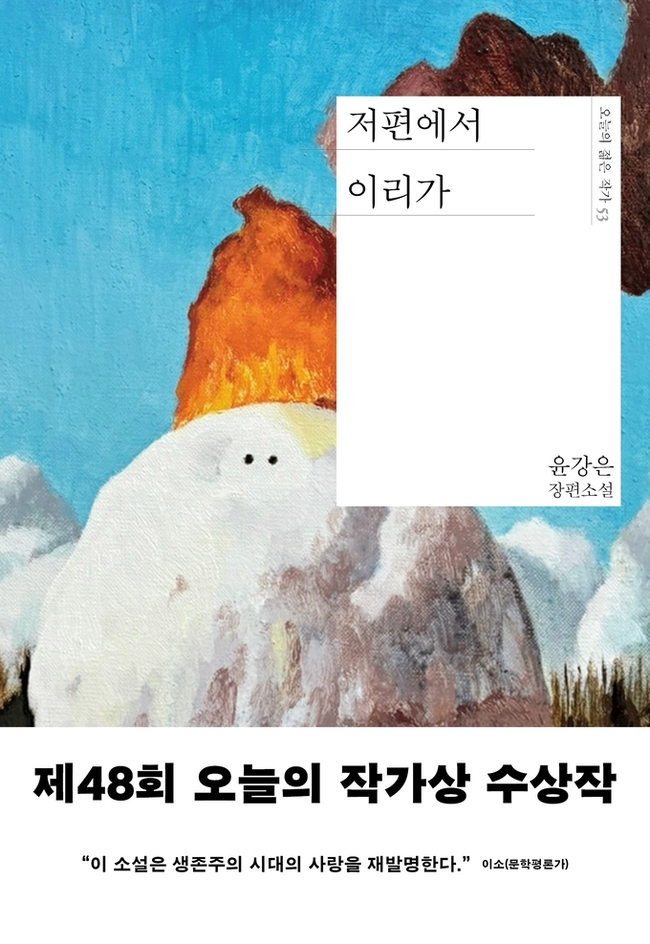
제48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 윤강은 장편소설 ‘저편에서 이리가’가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출간됐다. 10년 만에 공모제로 돌아온 오늘의 작가상 첫 해에 선정된 작품이자, 윤강은의 데뷔 장편이라는 점에서 문단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이 소설은 생존주의 시대의 사랑을 재발명한다”(문학평론가 이소)는 심사평처럼, 작품은 대멸종 이후의 한반도를 배경으로 생존과 사랑, 우정과 연대를 새롭게 사유하는 본격 디스토피아 서사다.
“어느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 언제 다다르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저편에서.”
작품의 첫머리에서 울려 나오는 이 문장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정조를 잘 보여 준다. 세계는 참혹하지만, 그 참혹함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마음만은 끝내 따뜻하게 남아 있는, 그런 종말 이후의 풍경이다.
△대멸종 이후, 세 구역으로 쪼개진 한반도
‘저편에서 이리가’의 무대는 자원이 고갈되고 기술이 도태된 ‘미래의 한반도’다. 거대한 국가는 이미 해체되었고, 남은 땅은 세 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뉘어 서로 겨우겨우 의존하며 버틴다. 남해안 인근의 ‘온실 마을’은 곡식과 육류를 생산하는 식량 기지, 중부의 ‘한강 구역’은 철을 가공하는 군수 생산지, 북쪽 ‘압록강 기지’는 대륙과 맞붙은 최전방 경계로 기능한다.
이 세계의 물류는 개 썰매가 대신하고, 에너지는 사람의 몸이 메운다. 눈보라와 한기, 화이트아웃과 크레바스는 더 이상 뉴스 속 재난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에게 평생 몸에 스며 있는 환경이다. 작가는 이처럼 “거대한 국가의 몰락 이후, 다시 원초적 조건으로 회귀한 한반도”를 세밀하게 그려내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공간에 전혀 다른 얼굴을 씌운다.
세 구역은 서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어느 날 촉발된 전쟁으로 질서는 한순간 무너진다. 소설은 바로 이 지점, 국가와 제도가 기능을 멈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규칙과 질서가 사라진 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라고 부를 것인가.
△경계 위를 걷는 다섯 청년, ‘우리’의 이름을 다시 쓰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경계 안팎을 오가는 다섯 청년이 있다. 구역과 구역을 연결하는 짐꾼 유안과 화린,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 기주와 백건, 국경을 넘는 태하. 각자의 소속과 임무는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정해진 울타리 안에 머무르기보다, 직접 눈과 몸으로 세계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다.
유안과 화린은 개 썰매를 몰고 남해와 압록강 사이의 설원을 한 달 가까이 종단한다. 그 길 위에서 눈보라와 폭설, 얼음 틈과 화이트아웃을 견디며, ‘규칙’보다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운다. 기주와 백건, 태하는 기술 장비 하나 없이 얼음을 깎아 장벽을 쌓고, 신체 훈련으로 전쟁을 준비한다. 이들에게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서히 스며들어온 한겨울의 한기 같은 것이다.
국가와 조직의 체계가 붕괴하고, 생존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진 순간, 인물들은 각자 마음속에 감춰 두었던 다른 가능성을 꺼내 든다. 친구에 대한 그리움, 사라진 이들에 대한 기억, 아직 만나지 못한 존재를 향한 호기심. 소설은 이들이 그 마음을 따라 경계를 넘고, 버려진 땅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멸종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생명력, 인간과 비인간의 새로운 연대
‘저편에서 이리가’가 그려내는 희망의 원천은 ‘생명력’에 대한 믿음이다. 작가는 인간의 생존만을 특권화하지 않고,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져 가는 비인간 존재들까지 시야에 포괄한다.
짐꾼 유안은 틈틈이 죽은 친구에게서 받은 ‘생명도감’을 펼쳐 본다. 대부분 멸종한 동식물이 실려 있는 그 책을 통해, 유안은 눈 아래 묻혀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씨앗들의 시간을 상상한다. 화린은 설원에서 유령 같은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따라가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짐승의 하울링에 귀를 기울인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기척, ‘저편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그 자체로 미래의 가능성이 된다.
군인 기주, 백건, 태하는 전선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버틴다. 친구라는 말이 사라진 시대에도 끝까지 우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 작품이 그려 내는 새로운 ‘생존주의’의 핵심이다. 생존이 누군가를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같이 살아남기 위해 손을 내미는 행동일 수 있는가. 소설은 이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간다.
△ 생존주의 시대에 사랑을 재발명하는 소설
발문과 심사평에서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인류세의 주체를 그려 낸 소설”, “생존과 사랑을 결합하는 새로운 생존주의의 모색”으로 읽어낸다. 성장과 생존, 생존과 연대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 ‘저편에서 이리가’는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도망치자”고 외치는 인물들을 통해 생존을 부끄러움이 아닌 책임의 언어로 바꿔 쓴다.
소설은 “나는 도망치지 않아”라고 말하는 영웅 서사를 거부한다. 대신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기억하며,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생존이 윤리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냉혹함도, 나 하나를 지우는 자기희생도 아니다. 과거를 애도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 이 자리의 삶을 함께 돌보려는 태도라는 것이다.
정용준 소설가는 심사평에서 “땅은 무너졌지만 하늘은 푸르고, 세계는 참혹하게 부서졌지만 전선을 오가는 사람들은 따뜻한 희망을 품고 있다”고 썼다. 문지혁 소설가는 “한반도라는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매력적”이라고 평했고, 김희선 소설가는 “싸우고 죽이는 대신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 가려는 애틋함이 종말의 얼음까지 녹일 것 같다”고 말했다.
종말 이후를 상상하는 많은 서사가 절망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우는 데 비해, ‘저편에서 이리가’는 “저편에서 들려오는 이리의 울음”을 두려움이 아닌, 아직 닿지 않은 희망의 신호로 바꾸어 읽는다.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소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랑과 연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