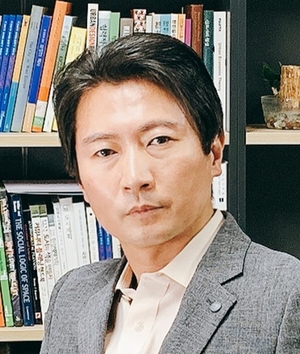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받아보면 지방선거 여론조사이거나 후보자의 인사말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 시내 교차로에는 플래카드가 걸리기 시작했고, 익숙한 얼굴뿐 아니라 새롭게 출마하는 듯한 낯선 인물들도 적지 않다. 언뜻 보기에도 열 명 안팎이나 되는 후보들이 이미 탐색전에 돌입한 것 같다. 지방선거를 반년 넘게 앞둔 시점이지만 경쟁은 벌써 시작된 것이다.
한편,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의아한 마음도 든다. 지방도시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맞물려 내년은 물론 내후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난제’가 쌓여 있는 정점에 그들이 원하는 자리가 놓여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독배’가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금의환향’의 성공 모델이다. 중앙부처나 기업 등 여러 영역에서 경력을 쌓은 엘리트가 고향으로 돌아와 최고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은 익숙한 풍경이다. 자신이 자라온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서 최고의 리더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건 성공추구와 회귀본능이 잘 만나는 곳에 놓인 로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지자체장만이 가질 수 있는 도시개발의 권한이다. 녹지를 개발해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여건이 맞으면 도로·철도·항만을 건설해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지도 위에 그려진 도시의 형태 자체를 바꿔놓는 일, 지역민 전체를 들뜨게 만드는 개발의 마법은 지자체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다. 중앙부처의 고위직이라 해도 쉽게 맛보기 어려운 권한이라는 점에서 유혹은 더 커진다.
이런 권한이 처음부터 지방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가 도입된 1995년 이전만 해도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모두 중앙이 임명하는 자리였고, 지역 개발사업의 큰 방향 역시 중앙정부가 결정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권한(특히 도시개발과 관련된 권한)이 꾸준히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이제 지자체장은 임기 동안 굵직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발판으로 중앙정치에 도전하는 경로가 하나의 전형처럼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은 자연스레 ‘큰 사업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리더십이 유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도시를 둘러싼 조건은 급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인구 증가를 담보로 개발사업을 지를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인구감소, 빈집 증가, 공실 확대 등 축소의 징후는 이미 여러 곳에서 뚜렷하다. 성장과 팽창을 전제로 한 과감한 개발형 리더십은 시대적 기반을 잃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며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리더십일지 모른다. 개발 프로젝트를 앞세우는 ‘아버지형’ 리더가 아니라, 매일 가계부를 챙기며 어디에 쓰고 어디를 아낄지 꼼꼼히 판단하는 ‘주부형’ 리더십일 수 있다. 축소 시대에는 도시의 체질을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지역의 작동 방식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 시간이 흐른 만큼 지방정부의 현실과 과제도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성공 패턴만 되풀이하려 한다면, 지자체장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긴 고역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대의 변곡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첫 번째 조건일 것이다.

